[칼럼] 나영무 박사의 '말기 암 극복기'(8)
-
1368회 연결
-
0회 연결
본문
"밥맛 생기고 통증도 줄었어요"…범생이 1인실 환자 바꾼 것
“내 몸을 살리는 100세 근육을 주제로 특강 해주실 수 있나요?”
2021년 4월 KBS 아침마당 팀에서 나에게 방송 출연을 요청해 왔다.
항암치료가 진행중이라 한동안 망설였다.
‘생방송이라 실수하면 큰일인데. 혹시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지면 어떡하지’ 등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환자라는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하기로 했다.
생방송 직전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복부와 하체에 힘을 단단히 주었다. 항암 부작용으로 발톱에 심한 염증과 통증이 있었지만 안 아프게 보이려고 무대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나갔다.
그리고 걱정과는 달리 방송하는 동안 내 몸은 잘 버텨주었다.
방송 막바지에 진행자가 “암투병 중이신데 아침마당에 나온 소감은 어떠냐”고 물었고, 나는 주저없이 “살아있다는 느낌이다”고 답했다.
순간 내 가슴 한구석에서 벅찬 감정이 올라왔다.
나만의 작은 틀에서 깨어나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서다.
암환자에게 항암 부작용 만큼 힘든 것을 꼽으라면 단연 ‘사회적 격리’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른다.

사회적 격리의 시작은 갑작스런 외모 변화다.
암환자 특유의 노랗고 수척한 얼굴, 피곤한 표정, 탈모, 부자연스런 걸음걸이 등 초라해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
또한 암환자는 겉으론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는 듯 해도 금세 지치고 피로함을 느껴 외출도 꺼려한다.
이처럼 처음엔 암환자가 사람을 피한다.
이 같은 관계가 굳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간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동시에 소외감이 찾아오고, 버림받은 기분까지 더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다.
암 진단을 받을 당시 내 소식을 들은 지인이나 후배들이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기 암’ 단어가 주는 중압감 때문인지 연락이 뜸해졌다.
그들은 ‘괜히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까’ 지레 겁을 먹고 선뜻 안부를 묻지 못한 것이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나도 서운함이 생긴다.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암으로 비롯된 대인관계 단절의 흐름도다.
결국 암환자는 집안에 틀어박혀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게 된다.
정상적인 사람도 오랜 기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없던 병도 생기는데 암환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고독감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 등 별별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 우울함과 불안함이 마음을 점령한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꼴이다.
나 역시 한동안 우울증과 무기력감 속에서 지낸 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처방전이 필요하다.
‘집에 누워있으면 죽고, 밖으로 나와 걸어다니면 산다’는 말에 모든 해결책이 들어 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극적인 변화를 꾀하고, 사회적 격리가 주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환경 변화를 통한 효과는 내가 운영중인 병원에서 많이 보았다.
몇 년 전 66세 남자 환자 한 분이 척추협착증과 고관절 통증 등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 1인실을 쓰면서 병실과 치료실만 오가는 조용한 모범생 스타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회진 시간에 환자는 “입맛도 별로 없고, 통증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한 뒤 환자에게 “운동선수와 젊은 친구들이 있는 4인실로 한번 옮겨보실래요”라고 권유했고, 환자도 받아들였다.
그 환자는 처음엔 쉴새없이 왁자지껄 떠드는 분위기를 낯설어했다.
하지만 차츰 대화도 나누면서 젊은 친구들이 뿜어내는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에 젖어 들었다.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맛이 있듯 식사도 잘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도 보였다. 치료 효과가 좋은 것은 물론이다.
60대 환자는 치킨과 피자를 동료 환자들에게 쏘며 기분좋은 발걸음으로 병원 문을 나섰다.
그만큼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하다. 투병기간 중 나는 암환자들만 생활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며칠 묵으러 간 적이 있다.
하지만 그리 유쾌하지 않은 분위기에 압도돼 하루만에 퇴소하고 말았다.
암환자가 사회적 끈을 잇는 방법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취미나 봉사활동 등 일부러 일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병원으로 꾸준히 출근했다.
수술과 회복, 그리고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병원에 나왔다. 단 1명의 환자를 보더라도 의사로서 소임을 다하며 사회적 연결고리를 이어가려는 간절한 의지였다.
초기엔 고난의 연속이었다.
계속된 항암치료로 인해 말투는 다소 어눌했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할 때는 미안하고, 스스로 화가 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착한 환자들 덕분에 나의 진료는 멈춤없이 계속됐고, 목소리도 정상으로 돌아와 오늘도 환자들과 행복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다.
바로 이럴 때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음을 강하게 느낀다.
나는 직장으로 복귀하는 암환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대부분 자신감이 떨어져 출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자신의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자칫 무리해서 건강이 또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가진다.
그러다 병가에 이어 휴직, 그리고 사직으로 귀착되는 코스를 밟는 것을 자주 보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암과의 사투를 이겨낸 사람들이야말로 대단한 의지를 지녔다.
모진 시간을 견뎌낸 인내와 끈기의 힘은 조직 발전에도 분명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와 조직이 암환자에게 보다 깊은 이해와 배려를 통해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
이번 칼럼을 마무리하는데 지인에게 문자 한통이 왔다.
“순자 맹자 노자 장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웃자’라고 합니다.
웃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함께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웃으며 함께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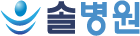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