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영무 박사의 '말기 암 극복기'(3)
-
1376회 연결
-
0회 연결
본문
교활한 암, 항암치료 혹독…매일 구토한 내게 힘을 준 한가지

암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매일 생겨난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포가 아닌 내 몸안의 세포다.
의학적으로 보면 내 몸의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암세포는 무서운 존재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잘 아는 암세포이기에 생존능력이 뛰어나고 성장속도가 빠르다.
세력 확장(증식)을 위해 건강한 세포에 침투한 뒤 에너지를 뺏어온다.
또한 전이 능력도 탁월하다.
암세포는 혈관속으로 파고들어 피를 따라 이동하면서 다른 장기들에 달라붙어 자란다.
아마도 치아, 손톱, 발톱 등을 제외하곤 우리 몸 어디에서든 성장할 수 있는 활동성을 지녔다.
암이 국소 질환이 아닌 전신 질환으로 불리는 이유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암세포를 단칼에 제압하기는 어렵다.

중앙포토
암세포를 공격하는 무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항암약물치료(항암치료)다.
항암치료는 암세포 크기를 줄여줄 뿐 아니라 전이를 방지하고,
재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도망자’ 암세포와 ‘추격자’ 항암제의 쫓고 쫓기는 관계 속에서 암세포는 교활하고 영리하다.
암세포는 항암제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귀신같이 알아챈다.
줄기세포나 혈관 등 자신만의 은신처로 잽싸게 몸을 숨겨 쥐죽은 듯이 지낸다.
그러다 항암제의 약발이 서서히 떨어질 무렵 발톱을 드러낸 뒤
맹렬한 힘을 폭발시키며 내 몸을 괴롭혀댄다.
이처럼 항암치료는 영악한 암세포와의 고단한 숨바꼭질이다.
꼭꼭 숨어있는 암세포를 찾아 뿌리를 뽑아내는 숨바꼭질의 결과에 따라 항암치료의 횟수가 좌우된다.
이는 암 환자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항암치료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항암제의 독성이 몸에 쌓여 더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항암제는 암세포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빠르게 분열하고 증식하는 모든 세포를 공격한다.
소화기관을 비롯해 머리카락 세포, 골수의 조혈모세포, 피부세포, 구강과 장 점막세포 등 전신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나에게도 항암치료의 후유증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다.(4편에서 구체적부작용 종류 소개)
항암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 다가오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항암제 주사실 특유의 소독약과 화학약품 냄새, 항암제를 맞고 나면 수시로 토하고 입부터 항문까지 전해진 고통 등 무서웠던 기억들이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라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항암치료 요법은(나의 경우) 먼저 구토방지제가 투여된 뒤 표적항암제인 얼비툭스를 맞고, 캠푸토(이리노테칸)과 5-FU(5-플루오로우라실)라는 암세포 합성 차단과 성장을 억제하는 세 종류의 항암제를 순차적으로 맞는다(ERBITUX + FOLFIRI). 재발했을 때에는 약제를 바꾸었다.
차가운 항암제가 혈관에 들어가면 체온이 떨어지고 싸하면서 기분 나쁜 느낌이 내 몸을 훑고 지나간다.
하늘이 노래지고, 귀가 멍하며, 무기력감이 전신을 휘감아 휴대폰이나 TV 리모컨을 들기도 힘들다.
항암제와 함께 주렁주렁 달린 수액 등으로 야간에는 여러번 화장실을 들락거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밥 냄새를 맡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수술 후 첫 항암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에는 하루 종일 복통과 설사가 멈추지 않아 탈진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간 적도 있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며칠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는데다 충분히 먹지도 못해 60㎏였던 몸무게가 51㎏으로 감소할 만큼 야위어 갔다.
하지만 항암치료가 주는 혹독함 만큼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은 더 커졌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힘이 들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라는 노래가사를 떠올리며 나를 응원해 주는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버텨나갔다.
항암치료는 2주 간격으로 2박3일간 입원해서 받기도 하고, 통원하면서 받기도 한다.
항암제가 투여된 후 3일 가량은 그야말로 몸이 녹다운된다.
이어 3~4일이 지나면 차츰 기운이 차려지고 1주일쯤 50~60% 회복된다.
그러다 몸이 쌩쌩함을 느낄 무렵이면 다시 항암치료 받는 날이 성큼 다가온다.
정상적인 몸 상태를 느긋하게 누려보지 못한 채 간만 보다가 항암제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항암제를 맞으러 갈 때마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 주사였으면...” 하는 간절함이 가득했고, 결국 36번의 항암치료 끝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여정이었지만 우리 인간은 막상 닥치게 되면 견뎌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항암치료가 아프고 힘들어도 끝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내 몸이 열심히 암세포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참을 만 했다.
암세포가 나에게 준 선물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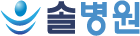
댓글목록 0